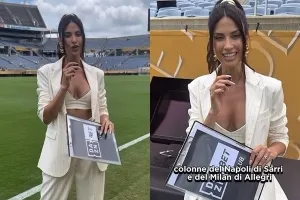“치매에 집 나가 행적 알 수 없는 건 소설 속 ‘엄마’가 아니라 한국 문학”
소설가 신경숙(52)씨의 표절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표절 논란을 넘어 한국 문학권력 문제로 확산되면서 문단의 자정 운동을 촉발했다. 문단 내에선 표절은 신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출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한국 문단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3일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이명원(왼쪽 두 번째) 경희대 교수가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와 문학 권력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발제자로 나선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돈과 패거리 권력으로 무장된 한국 문학이 신경숙 사태를 낳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신경숙은 환금성이 탁월한 작가였고 백낙청 교수는 신경숙의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 문학의 보람’이라는 말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창비와의 미학적 연결망을 찾아내고자 했다”며 “치매 상태에서 집을 나가 행적을 알 수 없는 건 신경숙 소설(엄마를 부탁해) 속 ‘엄마’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 문학’”이라고 꼬집었다. 문학비평가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겨눴다. 이 교수는 “현재의 비평 공간에서 이견을 지닌 비평가 대부분은 한 줌의 중심 질서 바깥에 ‘비체제’ 지식인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며 “(문학비평의 기능이) 비평적 담론과는 완전히 무관한 산업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창은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교수는 문학권력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1990년대 출판 상업주의와 동인과 에콜 중심으로 작동하는 문학권력의 폐쇄성에서 신경숙 사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20년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고 그 폐쇄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신경숙 표절에 대해 창비가 대응했던 게 한국 문학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민낯을 드러낸 건 한국 문학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단의 건강한 질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전복적 흐름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문학적 신념에 따라 작가들의 이합집산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신경숙 표절 사건은 한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학에 작동하는 문학권력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의 촉발점이 돼야 한다”며 뼈아픈 성찰 속에서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인 심보선 시인(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은 “이윤지상주의와 한국문학지상주의가 기이하고 모순적인 방법으로 결탁해 있다. 이 결탁 속에서 특정 작가에 대한 애정이 하나의 조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특정 작가들을 거의 가족처럼 돌보는 무한 애정 유사가족주의 문화 속에서 표절을 끝내 표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표절과 표절 은폐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대안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표절과 관련해 법적 기준까진 아니더라도 윤리규정, 원칙과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등단 시스템, 문학매체 발간 시스템, 문학상 수여 시스템, 문학출판 관행 등 일련의 문학 질서를 전복할 문학권력의 외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시인은 “비평 자체가 아니라 권력화된 비평이 문제”라며 “신경숙은 우리의 에이스가 아니다. 에이스 발굴과 육성이라는 비평적 강박에서 벗어나 한국 문학의 다양한 글쓰기와 활동의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6-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