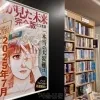м „л¬ёлҢҖмқҳ көҗмңЎ лӘ©м ҒмқҖ көӯк°ҖмӮ¬нҡҢ л°ңм „м—җ н•„мҡ”н•ң м „л¬ём§Ғм—…мқёмқҳ м–‘м„ұмқҙлӢӨ. н•ҳм§Җл§Ң м „л¬ёлҢҖлҠ” н•ҷл Ҙ мӨ‘мӢң л°Ҹ н•ҷл Ҙ мқён”Ңл Ҳ мҶҚм—җ ліҖм§Ҳмқ„ лҗҳн’Җмқҙн–ҲлӢӨ. 4л…„м ң лҢҖн•ҷмқҳ н•ҳл¶Җкё°кҙҖ, 4л…„м ңлЎң к°ҖлҠ” 징кІҖлӢӨлҰ¬лқјлҠ” мқёмӢқлҸ„ л§Ңл§Ңм°®лӢӨ. м§ҖлӮңн•ҙ мӢ мһ…мғқ 충мӣҗмңЁмқҖ 94%, мһ¬н•ҷмғқ мӨ‘нҮҙмңЁмқҖ 8%к°Җлҹүм—җ лӢ¬н–ҲлӢӨ. м§Җл°©мқҳ лӘҮлӘҮ м „л¬ёлҢҖлҠ” м •мӣҗмқҳ м Ҳл°ҳлҸ„ лӘ» мұ„мӣ лӢӨ. мӢ¬к°Ғн•ң мҲҳмӨҖмқҙлӢӨ. мһ¬м •мғҒнҷ© м—ӯмӢң м•…нҷ”лҗ мҲҳл°–м—җ м—ҶлӢӨ. лҚ”мҡұмқҙ 2015л…„л¶Җн„° кі көҗ мЎём—…мғқ мҲҳмқҳ лҢҖнҸӯм Ғмқё к°җмҶҢм—җ л”°лқј м •мӣҗмқ„ мұ„мҡ°кё°лҸ„ лІ…м°° нҳ•нҺёмқҙлӢӨ.
м „л¬ёлҢҖлҠ” мң„кё°м—җ лҶ“м—¬ мһҲлӢӨ. к·ёл ҮлӢӨкі мҷёнҳ• лӢЁмһҘл§ҢмңјлЎңлҠ” к·№ліөн• мҲҳ м—ҶлӢӨ. 1997л…„ м „л¬ёлҢҖлҠ” лҢҖн•ҷмңјлЎң, 2009л…„ м „л¬ёлҢҖ н•ҷмһҘмқҖ мҙқмһҘмңјлЎң л°”кҝЁлӢӨ. н•ҷмғқкіј н•ҷл¶ҖлӘЁл“Өмқҙ нҳјлһҖмҠӨлҹ¬мӣҢн•ҳкі мһҲлӢӨ. м „л¬ёлҢҖлҠ” мӢңлҢҖмқҳ ліҖнҷ”м—җ л§һм¶ҳ н•ҷкіј мӢ м„Ө л°Ҹ нҠ№м„ұнҷ”, м§Җм—ӯмӮ¬нҡҢмҷҖмқҳ м—°кі„, лҢҖн•ҷлҒјлҰ¬мқҳ нҶөнҸҗн•© л“ұ кіјк°җн•ң кө¬мЎ°к°ңнҳҒмқ„ лӢЁн–үн•ҙм•ј н•ңлӢӨ. лӮҙмӢӨмқ„ лӢӨм§ҖлҠ” кІҢ мң„кё°лҘј к·№ліөн• мҲҳ мһҲлҠ” н•ҙлІ•мқҙлӢӨ. лҲҲк°ҖлҰ¬кі м•„мӣ… мӢқмңјлЎңлҠ” м•Ҳ лҗңлӢӨ. мҳҒм§„м „л¬ё, мқёмІңкіөм—…м „л¬ё, кІҪл¶Ғм „л¬ё л“ұмқҙ м „л¬ёлҢҖ лӘ…м№ӯмқ„ кі мҲҳн•ҳлҠ” мқҙмң лҸ„ л”°м ёлҙ„ м§Ғн•ҳлӢӨ. көҗкіјл¶ҖлҸ„ м „л¬ёлҢҖмқҳ нҮҙлЎңлҘј л§Ҳл Ён•ҳлҠ” лҸҷмӢңм—җ нҸүмғқм§Ғм—…мқҙ м•„лӢҢ кі л“ұкөҗмңЎ, мҰү лҢҖн•ҷм •мұ… м°Ёмӣҗм—җм„ң м ‘к·јн•ҙм•ј н• кІғмқҙ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