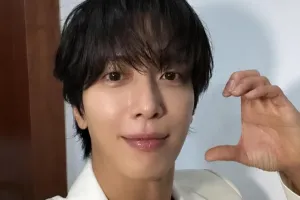강성민 글항아리 대표
‘21세기 자본’은 지난 300여년의 시계열(時系列) 자료를 분석해 자본을 소유한 자들에게 부의 집중이 가속화돼 21세기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가 무리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의 영역과 노동이 돈을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의 영역 간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 불안정과 체제 전복의 위협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내적 제도 보완을 조세정책의 변화에서 찾자는 이야기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 구현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기 힘들다. 피케티 또한 자신의 주장이 매우 ‘이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과 ‘이상한’ 것은 분명 다르다. 이상적인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이고, ‘이상한’ 것은 현실의 여건과는 전혀 무관한 빗나간 관점을 일컫는다.
주류경제학에서 불평등이나 분배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매우 적다. 왜 주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가. 피케티도 이 책의 결론에서 “그동안 학자들은 그들이 설명하려는 경제적 사실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술도 없이 순수한 이론적 고찰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학은 ‘경제과학’이라는 자부심을 얻었지만, 체제와 한 배를 타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이번에 피케티가 입증한 지난 300여년의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수많은 방식으로 검증되거나 반박되고, 더욱 보강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상을 얻어나갈 때, 또한 그것이 주류경제학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수치화될 때 정치경제학과 경제수학의 어떤 통합적 분석모델이 학문적 시민권을 확고히 하리라고 본다. ‘21세기 자본’이 그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이번에 이 책을 편집하면서 매우 괴로운 자기반성에 도달하게 됐다. 우리가 얼마나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용어조차 모르고 살아가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이 책에 나오는 경제학 용어들에 ‘전문용어’라는 단어를 부끄러움 없이 쓸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제학 내부에서는 그리 전문적이지도 않은 상식적인 용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케티는 제1장에서는 용어와 개념을 쉽게 풀이하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늦었지만 그러한 용어와 그 이면에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다. 이와 관련해 더욱 치열해질 논의들은 매우 장기간의 거시담론을 이뤄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저 구경꾼으로 남지 않으려면, 불평등의 문제를 최선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구조화시킨 이 거대한 모자이크화의 조각 하나하나를 자신의 손으로 모두 헐었다 재조립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2014-07-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